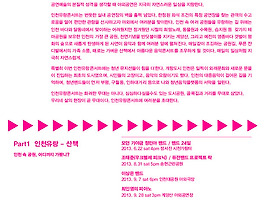국악관현악단 입단 실패하고 전화상담원·편의점 알바생활
전형적인 88만원 세대이지만 홍대클럽서 자작곡 노래하는 가야금 인디뮤지션으로 활약
촛불시위때 세상에 눈뜨기도 70년대 ‘세시봉’ 있었다면 2000년대 홍대엔 ‘바다비’
눅진눅진해서 오히려 정겨웠던 뮤지션들의 학교이자 아지트 ‘최고의 쓰레기’들이 모여 스스로를 치유해 나간 기적
“우리가 죄인이지, 젊은 애들한테 일자리도 못 만들어 주는 어른들이 무슨 할 말이 있어?” 내 연배 사람들과 술 한잔 걸치다 보면 어느 자리든 긴 한숨과 함께 이런 탄식이 새나온다. 여기엔 두 가지 아이러니가 숨어 있다. 첫째, 시곗바늘을 되돌려 이 얘기를 하는 장년층이 ‘젊은 애들’이던 시절, 지금처럼 한잔할 때 나누던 얘기가 “이런 세상을 자식들에겐 물려주지 말자”였는데, 젊은이들이 느닷없이 감옥으로, 고문실로 끌려가는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고만 했지 거대한 시대적 산업적 변화에 우리 자신 대책 없이 무방비로 끌려올 줄 미처 몰랐다는 점. 둘째, 스스로 “말할 자격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이 어르신들, 젊은이만 보면 여전히 뭔가를 가르치고 훈계하려 드는 꼰대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2030세대에 대한 4050세대의 시선은 사뭇 봉건적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자책감과 보호본능.
무능한 보호자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젊은이들 내부에서 스스로 바라보는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모던 가야그머”라 칭하는 젊은 여성 뮤지션 정민아(1979년생)를 만나면 그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국악고와 한양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숙명가야금연주단에서 활동한 촉망받는 국악인이었지만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전화상담원, 학습지 교사, 편의점 알바 등을 전전한 전형적인 88만원 세대. 가야금을 연주하며 자작곡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홍대 앞 클럽을 주무대로 활동하지만 용산 피해자들이나 이랜드노조, 이주노동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기꺼이 거리에 서는 “개념탑재녀.”
계산대 점원 하다 첫 무대에 선 사연
5월의 마지막 일요일, 홍대 앞 작은 공연장 ‘씨클라우드’에서 열리는 정민아 콘서트를 보러 갔다. 인터뷰 준비차 온 사람임을 알면서도, 에누리 없이(!) 입장료를 받는다. 군말 없이 티켓을 사고 카운터에 진열된 시디(CD)도 두 장 샀다. 50~60명가량 되는 관객들로 공연장이 빼곡해졌다. 나이 오십에 홍대 앞 클럽에 처음 진출했다는 사실에 자못 감격스러워하며 맥주 한 병을 들고 자리에 앉자 그녀가 등장했다. 눈망울이 크고 함박웃음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25현 개량가야금을 뜯으며 그녀가 노래를 시작했다.
“가난한 아가씨 어딜 가나요/ 부엉이는 울고 내 옷은 남루한데/ 내가 가는 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죠…/ 사랑은 마른 낙엽처럼 이리저리 뒹굴지만/ 바람은 내 마음대로 불지 않아요./ 무심한 바람은.”(정민아 작사·작곡 ‘가난한 아가씨’ 중에서)
바람 같은 목소리였다. 뱃속에서 듣던 어머니의 나지막한 읊조림 같은 그녀의 음성이, 가야금의 영롱하면서도 끈끈한 소리와 밀고 당기며 편안히 어우러졌다. 낯선 분위기에 곧추섰던 어깨의 긴장이 나도 모르게 눈 녹듯 풀어졌다.
국악평론가 윤중강이 “25현 가야금 연주자 중에 산조적인 연주를 할 줄 아는, 가장 전통적인 연주자”라고 평한 정민아는, 이제 국악의 울타리를 넘어 가야금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듯했다. ‘노란 샤쓰의 사나이’를 편곡해 노래하는가 하면, 베이스기타와 듀오로 14분짜리 재즈풍 ‘즉흥’을 연주하고, 아코디언과 주거니 받거니 ‘미나탱고’를 들려준다. 3일 후, 정민아를 만나러 씨클라우드를 다시 찾았다.
▶ 관련기사 더보기
'Soloist > 정민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5현 가야금의 여신 '모던 가야그머 정민아' 3월 30일 서울 반쥴 살롱 콘서트 (0) | 2016.03.17 |
|---|---|
| 가야금 싱어송라이터 '정민아' 라이브 토크콘서트, 10월 15일 태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0) | 2014.10.03 |
| 숙명가야금연주단 솔리스트 시리즈 '정민아' <튕기는 가야금, 끌리는 해금> 9월27일 오산문화예술회관 (0) | 2014.09.25 |
| '모던가야그머 정민아의 가을밤 현의 노래' 10월 11일 인천 부평문화사랑방 (0) | 2013.10.09 |
| 모던가야그머 정민아 4집 앨범<사람의 순간>발매 펀딩 프로젝트!! (8월 1일~9월 30일) (0) | 2013.08.03 |
| [공연정보] 모던 가야금 정민아밴드 6월 22일 인천 정서진 시천가람터에서 공연 (0) | 2013.06.21 |
| 김태춘, 정민아의 '발정의 시간' - 5월 24일(금) 부산 올모스트 페이머스에서 공연 (0) | 2013.05.22 |
| [공연정보] 모던가야그머 정민아의 반바지음악회 (4월 27일 남양주 이층카페) (0) | 2013.04.25 |
| [퓨전국악 듣기] 상사몽 - 정민아 (0) | 2013.03.19 |
| [퓨전국악 동영상] 주먹밥 - 정민아 (0) | 2013.03.18 |